"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절망에 빠진 사람이 새삼 어떤 평범한 대상의 아름다움을 목격한 뒤 극도로 감탄하며 내 뱉은 말이다.
참담한 현실, 깊이를 알 수 없는 모멸감, 수치심, 허탈함… 차마 믿기 어려운, 아니 믿기 싫은 진실에 뒤통수를 가격당한 지금의 우리들과 비슷할 수 있는 상황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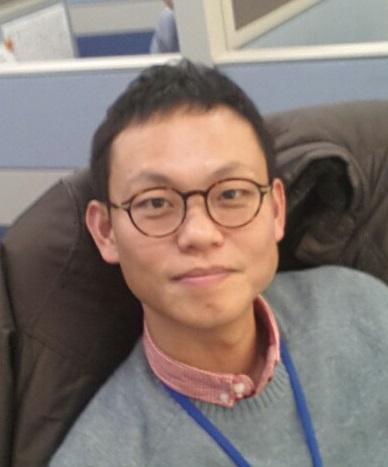
박관종 건설부동산부장
정신분석학의 거장 빅터 프랭클(1905~1997) 박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끌려간다.
삶의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그는 노역, 폭력, 굶주림, 수치심,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다.
어느 날 그와 동료들은 다른 수용소로 이송되기 위해 좁고 더러운 호송열차 안에 실린다. 한참을 이동하던 그들은 화물칸 작은 창살 사이로 석양빛에 빛나는 잘츠부르크 산 정상을 보게 된다. 그 순간 그들은 한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연의 아름다움에 도취된다. 지금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 내일이면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이내 잊는다.
그는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그날의 일들을 써 내려가며 "누군가 우리들의 얼굴을 보았다면 삶과 자유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의 얼굴이라고 믿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후에도 그는 나치 몰래 잠시 일손을 놓고 동료들과 멀리 보이는 숲의 풍경을 넋 놓고 바라보곤 했다. 그는 추운 겨울 넝마를 걸치고 참호 속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왜 죽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 애썼다. 죽음에 맞서 격렬히 항의 하는 동안 그는 그의 영혼이, 인간의 존엄함이 음울한 빛을 뚫고 나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공포만이 드리운 곳에서도 삶의 의지를 버리지 말고, 아름다움을 갈구하고, 희망을 만들라는 이야기다. 자신의 위대함과 존엄함을 깨닫고, 괴로운 현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희망이 눈에 띈다는 역설이다.
아우슈비츠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우리도 만만치 않은 비현실적 현실에 놓여 있다. 헐거워진 국가 시스템에 비집고 들어와 추악한 권력을 휘두른 무리들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송두리째 뽑아버렸다. 국가의 권위와 그나마 남아있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은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동안 무자비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우린 희망을 대하는 태도가 무뎌졌다. 이렇게 또 1년을 꾸역꾸역 채웠다.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기에 <이탈리아 장인의 바느질 처럼 한 땀 한 땀> 버텨온 세월이다.
괴롭고 힘들지만 어쩌겠는가. 지금 이 분노가 무관심이나 무감각으로 변질 돼서는 안 된다. 두 눈 부릅뜨고 저들을 지켜보자. 잔인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해 하자. 그 어떤 부당한 거래, 국민을 섬기지 않는 지도자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의 힘으로 깨닫게 하자. 민주주의와 정치 환경이 한 계단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면 된다.
이미 광화문에 모인 100만의 촛불이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 아름다운 행보가 앞으로 다가올 봄날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다시 힘을 내 새로운 1년을, 아니 100년을 희망으로 채울 때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있어 아름답다.
박관종 건설부동산부장
pkj313@etomato.com